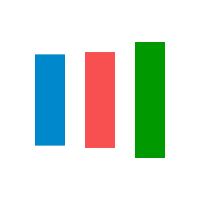어부바
어부바
엄마가 사시는 시골 동내에 가면 허리가 굽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다. 나이가 들면 키도 줄고 어느 정도 꾸부정 해지는게 일반적이겠지만, 도시의 할머니들 보다는 시골의 할머니들 중에서 허리가 굽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자식들을 많이 낳고 업어서 키운 것은 도시 할머니들도 마찬가지 였겠지만, 시골 할머니들은 자식들을 업고 꾸부정한 자세로 낮은 부뚜막에서 살림을 하거나 밭일 등을 해서 등이 굽은 분들이 더 많은게 아닌가 싶다. 엄마는 150 센치미터도 안되는 키로 여느 시골 아낙내들 처럼 우리 오남매를 업어서 키우며 농사일을 하셨다. 그리고 그 훈장으로 지금은 허리가 굽으셨고, 숨이 차서 한번에 오십보 이상을 걷지를 못하신다.
아기 때는 당연히 엄마가 나를 업어서 키웠을텐데, 어릴적 일이라 엄마에게 업힌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업어주거나 목마를 태워준 기억은 아직까지 생생하다. 아버지는 입학전인 내가 형과 누나들 어께 넘어로 배운 셈법을 아는게 신기 했는지, 저녁을 드시고 나면 종종 나를 무등 태워가지고 동내를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셨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웃의 자랑을 정겹게 받아들이던 때여서 마을 사람들은 나에게 “쌀가마 하나에 오만 오천원이면 다섯 가며면 얼마여?” 하는 식의 질문을 했고, 나는 암산으로 답을 대곤 했다. 나의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답을 확인 하려는 동내 분들도 없었다. 그저 아버지와 마을 어른 분들은 미취학 아이가 곱셈을 암산으로 한다는 것이 신기하셨을 뿐인것 같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를 업어준 것은 국민학교 2학년 때였다. 시골 학교에서 평택읍으로 학력 경시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새벽부터 나를 깨워서 버스정류장까지 오백 미터 남짓한 거리를 업고 가주셨다. 나는 아버지 등에 업혀 가는게 챙피해서 걷는다고 해도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자랑스러우셨는지 들쳐 업으셨고 엄마는 그런 부자의 옷자락을 잡고 옆에서 같이 걸으셨다. 가는 길에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동내 사람들이 새벽부터 길 넓이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시험보러 가는데 재수없다” 하시며 먼길로 돌아 가시기까지 하셨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더 이상 나를 업어 주시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나를 업기에 나도 어느 정도 커진 이유도 있었겠지만,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등에 업힐 짓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더 컷었던것 같다.
어부바 할 때는 업히는 사람이 몸에 힘을 빼고 손으로는 업는 사람의 목을 지긋히 둘러 잡고 자신의 몸을 최대한 밀착해야 업는 사람이 쉽다. 그리고 업는 사람은 지개질 하듯 상체를 30-40도 굽혀야 힘이 덜 들고 오래동안 업을수 있다. 이렇듯 어부바는 두 사람의 상호 협력도 필요하지만, 업는 이의 희생이 따르니까 어떤 면에서 상대방을 안아 주는 것보다 업어 주는게 더 각별한 애정 표현인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이몽룡도 춘향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안고 놀자’고 하지 않고 “업고 놀자”고 하면서 희생적 사랑을 노래 했나 보다.
아버지가 엄마를 ‘업고 놀다’가 동내 사람들에게 틀켜서 놀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둘째 누이에게 들은 적이 있다. 두분은 신혼 때부터 같이 교회를 같이 다니셨다. 교회를 가려면 산길을 따라 2키로 남짓 걸어야 했는데, 산길을 가다 보면 산 중턱쯤 성황당을 불가피하게 통과 하셔야만 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산어귀에 있는 큰 고목에 색깔 있는 천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잡신을 섬기는 성황당이 있는 마을이 있었다. 나도 한국을 떠나오기 전까지 이 성황당 길을 지나 다니곤 했는데, 혼자 걸을 때는 낮에도 음산하여 어쩔수 없이 종종 걸음으로 이 성황당 길을 통과하곤 했다. 더우기 불빛이 없는 저녁때 이 성황당을 지나려면 나도 모르게 뒷 목이 서늘해 지고 작은 부시럭 소리에 몸의 솜털이 다 설 지경이었다. 그런 곳이다 보니까, 엄마는 금요일 저녁 예배후 집으로 돌아올때 이 성황당을 지날때면 아버지가 옆에 있슴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워서 아예 눈을 감으셨다고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서워하는 엄마를 업고 이 성황당 길을 넘으셨다고 한다. 아마도 엄마는 아버지 등에 업혀서도 눈을 뜨지 못하고, ‘어디쯤 지나갔냐?’고 아버지에게 몇 번씩이나 물으셨을것 같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그러다가 동네 어른들한테 들켜서 놀림을 당하셨다고 한다.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면 카타르시스를 느껴 다시 보게 되는 것처럼, 엄마도 금요일 저녁마다 이 성황당을 지나는게 공포 그 자체 였음에도 그 시간을 기다리셨을것 같은 생각이 든다. 시골에 시집와서 아이 다섯에 시부모 모시고 사느라, 주위 사람들 눈치 않보고 남편하고 오붓하게 단 둘이 같이 있을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이 성황당 길이 었을 것이다. 지금이야 노 부부들도 손 붙잡고 다니는 것을 보기 좋다고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흉이 되는 시절이었다. 그런 시절에 집으로 돌아오는 이 성황당 길은 둘만의 데이트 길 이었고, 엄마나 아버지나 모두 기다려지는 시간 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성황당을 지나면서 따듯한 등의 온기로 시집살이에 곤한 아내에게 애틋한 마음을 전했을 것이고, 엄마는 아버지의 등에 업혀 지난 일주일 간의 고된 삶을 잠시나마 잊을수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엄마를 언제 마지막으로 업어 주셨는지는 모르겠다. 이제는 엄마를 업어 드릴 사람은 자식들 밖에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여지껏 엄마를 업어드려 본 적이 없었다. 예전 시골에는 자식이 출세를 하면 금의환향해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고생하신 부모님을 업고 덩실 덩실 춤을 추고 잔치를 열었는데, 나는 그렇게도 해 드리지 못했다. 아버지는 칠순 잔치때 사회자가 시켜서 업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환갑이나 칠순. 필순 잔치들 하나도 해 드리지 못해서 행사용 어부바도 못해 드렸다. 그땐 엄마가 ‘남사 스럽다’며 잔치 하는 것을 극구 사양하셨는데, 돌이켜 보면 자식들이 우겨서라고 해 드렸어야 했었다.
생전 처음으로 엄마를 어부바 해 드릴 계획을 꾸미고 있다. 올 연말 아내와 두 아들들을 모두 대동하고 엄마를 뵈러 가는데, 성인이 된 두 아들들에게 “할머니가 너희들이 어렸을때 업어서 키워 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할머니를 한번 업어 드려라” 하고 아이들에게 시키려 한다.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 엄마도 크게 거부 하시지는 않을것 같고, 평소 유쾌한 아내가 맞장구를 치면 자연스럽게 성공할수 있을것 같다. 그렇게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내가 기운 자랑을 하며 엄마를 업어 드려야 겠다. 비록 오십이 넘고 머리가 하얀 막내 아들이지만, 내 등에 업혀 엄마가 눈을 감고 잠깐이나마 아버지와의 옛 성황당길 어부바 추억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