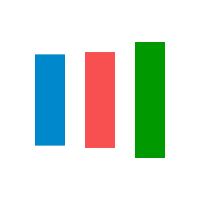콩국수
콩국수
엄마는 아침을 챙겨 주고 나서 누우시더니 이내 코를 골며 주무셨다. 내가 와서 요 몇일 일찍 아침을 챙겨 주느라 고단하셨나 보다. 한국에 오면 시차 때문에 일찍 일어나게 되는데, 엄마는 나의 인기척이 들리면 이내 일어나신다. 일어 나시자 마자 나에게 "배 고프지?" 하고 물으시고, 나의 대답과는 상관없이 아침을 준비 하신다. 미국에선 아침에 커피 한잔. 과일 하나 정도로 간단히 하는데 시골에만 오면 아침부터 어쩔수 없이 거하게 먹게 된다. 행여 잠시 한눈을 팔기라도 하면 엄마가 내 밥그릇에 당신의 밥을 계속 덜어 놔서 아침부터 어쩔수 없이 과식을 하곤 한다. 일년에 서너번 보는 막내 아들에게 '배가 나왔으니 운동해라' 하는 잔소리를 하시면서도 하루 종일 내 주위를 맴돌며 ‘이거 먹어 저거 먹어’ 하시며 어떻게라도 더 먹이려는 이중적인 행동을 하신다.
엄마는 두 시간쯤 주무시고 일어나더니 점심엔 콩국수를 해주신다고 분주해 하셨다. 전날 점심에 엄마와 콩국수 외식을 했는데 내가 잘먹는것을 보시고 당신이 직접 콩국수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엄마 콩은?" 하고 물으니까, 엄마는 배시시 웃으시며 "아까 담가 뒀어" 하신다. 콩국수가 간단해 보여도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이다. 엄마는 새벽에 일어나서 콩을 물에 담아 불리고 준비를 해 놓으시느라 잠이 모자라서 낮잠을 주무신 것이다. 일년 동안 한번도 안 썼다는 믹서기도 꺼내 닦으신후 부엌 바닥에 털푸덕 앉아서 밀가루로 반죽을 하셨다. 예전 같으면 대식구를 먹이느라 큰 교자상 같은 것을 펴놓고 세숫대야 크기의 그릇에 밀가루와 물을 붓고 두손으로 씩씩하게 반죽을 하셨을텐데, 이제는 엄마와 나 달랑 두사람 분량의 반죽을 하려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찰흙놀이 하듯 바가지 크기의 그릇에 담아 한손으로 조물조물 해가며 반죽을 하셨다. 완성된 반죽은 조그마한 도마에다 올려놓고 깨소금을 빻는 짜리몽땅한 방망이로 밀어서 엷은 빈대떡처럼 평평하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큰 계란말이 만들듯이 펴친 반죽을 밀가루를 뿌리며 둘둘 말은 후에 굵직 굵직하게 썰어 면발을 만드셨다.
나는 식탐도 있고 모든 음식을 잘 먹지만 특히 콩국수와 청국장을 좋아한다. 한국에서야 이런 음식들을 쉽게 먹을수 있겠지만 시카고에선 여간 귀한게 아니다. 아마도 어릴적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중에 이 두 음식만은 시카고에서는 쉽게 먹을수가 없어서 내가 ‘특히’ 좋아한다고 느끼는지도 모르겠다. 어쨋든 그나마 콩국수는 여름철에 몇몇 식당에서 메뉴로 하는집이 있어서 먹곤 하는데, 청국장은 특유의 냄새 때문에 대부분의 식당은 메뉴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먹어보면 ‘진짜 청국장’이 아니고 인스탄트 재료를 써서 만든 된장찌게에 가까운 수준이다. 어린시절 엄마가 해주던 방 아랫목에 이불까지 덮어서 푹 삭혀서 만든 청국장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시카고 단골 식당에 콩국수 메뉴가 등장하면 나는 어김없이 콩국수를 주문하고, 여름철이 끝나 메뉴를 내릴때까지 그 식당에 가면 주로 콩국수를 먹는다. 주인장들은 내 입맛이 초등입만인줄 알거나 아니면 자기가 만든 콩국수가 기가 막히게 맛있는줄 착각을 하겠지만, 사실 나는 콩국수 입맛이 꽤 까다롭다. 콩국수는 양념으로 맛을 내는 음식이 아니다. 순전히 콩물과 면빨 만으로 맛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콩으로 만들고, 어떻게 콩을 삶고, 콩물을 어떻게 걸러 내는지, 면발은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미묘한 맛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콩국수 전문 식당이 아니면 그런 긴 과정을 거치면서 콩국수를 만들면 아마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들을 건너 뛰거나 섯불리 빨리 하려 하면 콩 특유의 콩 비릿내가 나거나, 콩물을 잘 걸러내지 않으면 콩물이 걸쭉해져서 콩 국수의 맛을 제대로 낼수 없다. 그리고 하기 쉽게 밀가루 반죽을 질게 하면 면의 쫄깃한 면이 상대적으로 줄어 든다. 콩국수에 관한한 이정도의 빠꼼이가 엄마표 콩국수에 비해 현저하기 수준이 떨어지는 콩국수를 계속해서 시켜 먹는것은 예전 엄마가 해줬던 콩국수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짇기 때문인것 같다.
엄마의 콩국수는 언틋 보기에도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다. 면 위에 얹는 잘게 썬 오이도 없고, 색감을 위해 얹는 토마토도 없고, 고소한 맛을 더하라고 뿌리는 통깨도 없고, 하물며 시원함을 유지하기 위해 넣는 얼음도 없다. 면발도 기계로 뺀 면이나 중국집 면처럼 길고 먹음직 스럽지도 않다. 단지 서두르지 않고 만든 콩물과 충분히 주무르고 밀어서 만든 면이 전부이다. 그럼에도 통깨를 안넣어도 고소하고 고명을 안넣어도 감칠맛이 난다. 면은 짧고 볼품없지만 쫄면보다 더 쫄깃하다.
칠천원이면 쉽게 먹을수 있는 이 콩국수 한그릇을 엄마는 꾸부러진 허리로 반나절 넘게 걸려 만드셨다. 아마 막내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만드셨으리라. 나는 엄마가 해준 콩국수를 맛있게 먹으며 "엄마, 이제는 하지마. 먹고 싶으면 사먹으면 되지" 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엄마가 해준 마지막 콩국수가 아니기를 바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