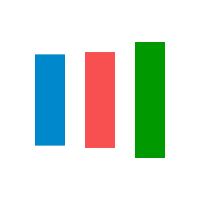선생과 스승
선생과 스승
'이 시대에는 선생은 많은데 참된 스승이 없다' 라는 말을 언론에서 자주 한다. 나는 선생과 스승의 차잇점을 정확히는 모르나, 느낌상으로 선생은 지식을 가르치는 '전문 기술자'란 의미로, 스승은 좀 더 형이상학적이고 고귀한 '도덕과 인간됨' 을 가르키는, 어떠한 면에서는 멘토에 가깝게 느껴질 뿐이다.
나에게도 그동안 많은 선생들과 스승들이 계셨다. 그분들로부터 많은 가르침과 좋은 조언들을 많이 들었지만, 정작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내 인생을 자꿔질 만큼의 큰 가르침이나 조언은 없었던것 같다. 나도 살다보면 후배들이나 젊은 친구들에게 조언이랍시고 포장된 말을 할 때가 있다. 그럴때면 나름대로 상황을 분석하고 근거를 제시해 가며 내 말의 타당성을 강조하곤 한다. 어떤때는 나의 논리에 자아 도취 되어 내가 그들의 생각과 인생의 방향을 바꿀수도 있을거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다. 한마디로 나혼자만의 착각이다. 위대한 성인들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고, 부모 말도 안듣는데 어떻게 타인의 말을 등불삼아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는가? 오히려 무심코 건낸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 측은지심으로 봐라봐 주던 눈길이 더 학생들을 올 곧게 지켜줄거란 생각이 든다.
나에게도 그런 선생님이 계셨다. 고등학교 1학년때 담임 이셨는데, 그 당시 나는 선생님들이 좋아할 부류의 학생은 아니었다. 시골서 평택으로 유학(?)와서 자취를 하는, 가끔 말썽을 부리는, 꾀재재한 시골아이였다. 그당시 내가 입학한 학교는 선발고사를 봐서 들어가는, 지방이지만 전교생이 대학을 가려고 들어온 소위 지방 명문고 였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야간 자율학습을 시켰고, 학생들은 점심 저녁용 도시락을 두개씩 싸 가지고 다녔다. 자취를 한 나는 두개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엄두도 못내 '찬합'이라고 불리는 둥그런 양은 통에 점심과 저녁에 먹을 밥만 싸가지고 다녔다. 반은 갈라서 점심에 먹고 나머지 반은 저녁에 먹는 그런 식이었다.
6월쯤인가 저녁 자율학습 시간전 저녁시간에 담임선생님이 들어 오셔서 아이들 저녁 먹는 것을 둘러 보셨다. 내자리를 지나실때 찬합에 반이 남은, 반을 가른 자리에 빨간 김칫 국물이 묻어있는, 여름이라 더워서 밥에서 약간의 쉰내가 나는, 그런 밥을 먹고 있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한마디 건내셨다. "병희는 찬합에다 밥을 싸오니?" 내가 "네" 하고 대답하니까, 선생님은 측은하게 몇초간 바라보시더니 내가 민망할까봐 더이상 아무말도 안하시고 자리를 뜨셨다.
나는 가끔 그때의 기억이 생각날 때가 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 선생님의 그 따듯한 한마디. 측은하게 바라보는 눈길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그것은 결코 나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런 눈길이 아니었다. 그 눈길은 본인도 겪어 봤음직한, 그래서 막내 동생뻘 되는 아이가 쉬밥을 먹는게 한없이 안스러운 그런 눈길 이었다. 그 눈길은 백마디 '사랑한다' 하는것 보다 더 뜨겁게 나의 가슴에 파고 들었었다.
두 아들들에게나 후배들에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독설을 가르침. 조언이랍시고 내밷고 후회할때먄 가끔 선생님의 눈빛이 생각난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묻곤 한다. 나는 한 인간의 가슴을 울린적이 있는 스승이었던가? 더 늦기전에 김영진 선생님을 꼭 찾아 뵈야겠다.